
수도 라바트는 몰라도 그 유명한 카사블랑카와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가 있는 나라가 북아프리카 모로코다. 스페인 여행에서도 헤라클레스의 신화가 깃든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나라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해협이라지만 짧게는 14㎞밖에 안 된다. 인천대교의 해상구간(12㎞)보다 조금 더 긴 정도다. 그래서 한때는 두 대륙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았는지 흐지부지됐다. 해협의 폭은 짧지만 1000m 안팎의 깊은 곳이 있는 해협이어서 다리 놓기도 쉽진 않았을 것이다.
마르코 폴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븐 바투타(Ibn Battuta)의 조국, 그가 극찬했던 풍요의 땅 모로코가 지금 큰 슬픔에 잠겨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한밤중에 마라케시 인근 70㎞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6.8 강진 여파로 벌써 사망자가 3000여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베르베르인들이 건설한 마라케시는 모로코를 상징하는 역사 도시이며, 구시가지 메디나는 모스크와 궁전 등 중세의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돼 있다. 특히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는 높이 69m의 '쿠투비아 모스크 미나렛(첨탑)'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모로코의 상징이다. 이번 지진으로 메디나 곳곳이 파괴되고 붉은 벽돌이 눈부셨던 쿠투비아 모스크의 미나렛 일부가 파손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다. 지브롤터 해협의 수심이 생각보다 깊은 것도 이런 이유다. 1960년 2월 마라케시 서남쪽 약 200㎞에 있는 항구 도시 아가디르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당시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5000여명이 사망했다. 이번 지진은 그 후 약 60년 만에 발생한 대참사다. 이웃 알제리에서도 1980년 규모 7.3의 강진으로 약 2500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지진에 취약한 지역임에도 안전이나 구호, 지원 등의 대응 시스템이 생각보다 열악한 것이 놀랍다.
모로코는 이웃 나라들과는 달리 입헌군주국이다. 정식 명칭도 '모로코 왕국'이다. 국왕 모하메드 6세는 1999년부터 24년째 국가원수이며 이슬람 최고지도자로서 절대적 존재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수천 명의 국민이 죽어가며 절규하고 있을 때 그는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 인근 호화 저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대응은커녕 재앙을 더 키운 셈이다. 지진 소식을 듣고 뒤늦게 귀국은 했다지만 스페인과 영국 등 몇 나라들 외에는 구호나 지원 요청도 하질 않았다. 그 사연도 궁금하지만 국가가 위기일 때 최고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혹시나 하며 가족을 기다릴 모로코 국민의 눈에서 메디나의 벽돌만큼이나 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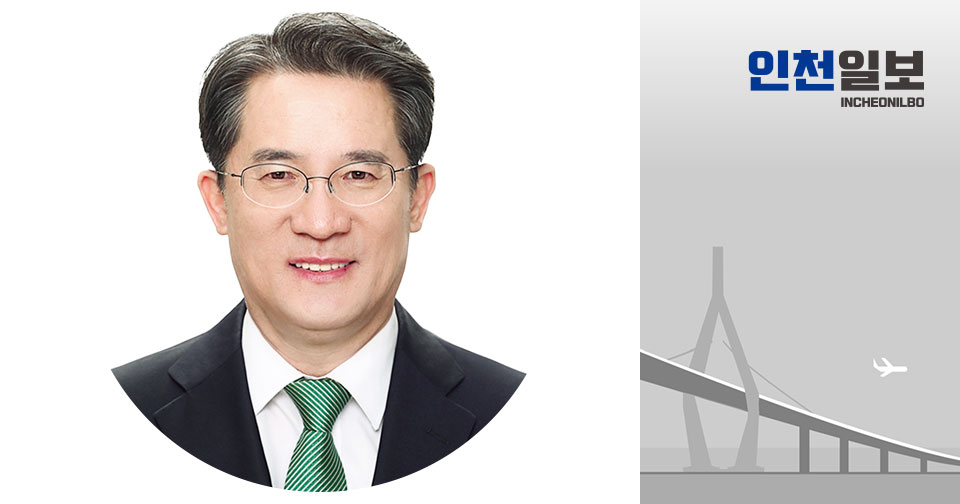
/박상병 시사평론가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